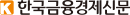정부가 세컨더리펀드 시장을 키운다. 2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모태펀드 주요 투자처로 `엔젤(개인투자자)펀드`와 `세컨더리펀드`를 잠정 확정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한다. 이병권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정책자금이 벤처기업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 시장도 등한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펀드는 엔젤·벤처캐피털이 보유한 스타트업·벤처 투자 지분을 매입한다.
투자 규모와 펀드 수는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올해 20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 회수자금 가운데 문화·영화·특허 등 특수 목적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상당분을 세컨더리펀드 결성에 지원한다. 펀드는 엔젤투자 지분을 인수하는 엔젤형 세컨더리펀드와 벤처캐피털 보유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캐피털형 펀드 두 가지로 조성한다. 올해 신규 확보한 모태펀드 예산은 500억원이다. 엔젤펀드 결성에 모두 활용될 예정이다.
세컨더리펀드=펀드 운용사인 벤처캐피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엔젤·벤처캐피털)가 보유 중인 벤처 주식(구주)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한다. 벤처기업에 바로 투자하는 `프라이머리펀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벤처펀드 운용기간이 5~7년인 가운데 피투자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인수합병(M&A)에 나서지 않아 벤처캐피털이 자금회수(Exit)에 어려움을 겪을 때 대안 시장 역할을 한다.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정부 세컨더리펀드 시장 조성 계획에 대한 모 벤처캐피털업체 대표 말이다. 벤처캐피털의 가장 큰 어려움은 `투자금 회수(Exit)`다. 회수는 벤처캐피털 투자 성과판단 기준이며, 새로운 투자 기반이다. 하지만 그 시장이 미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하다. 미국은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이라는 확실한 시장이 있다. 경기 침체로 나스닥 지수가 저조하면 벤처캐피털은 M&A시장을 활용한다. 반대 경우는 IPO를 이용한다. 여기에 세컨더리펀드 시장도 벤처투자 시장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IPO 이외에 대안이 없다. M&A시장은 활성화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 수년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 벤처가 호의적이지 않다. 코스닥 시장 진입도 쉽지 않다. 벤처캐피털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 5~7년 펀드 만기가 도래한 경우다. 불가피하게 자체 자산(본계정)으로 인수하거나, 부실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벤처캐피털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는 투자자 유치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벤처캐피털이 초기 투자에 나서지 않는 요인도 된다. 이른바 리스크(위험)를 떠안지 않고 상장 직전 프리IPO 기업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비판을 받는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세컨더리펀드 시장이 없다면 벤처캐피털 회수시장은 IPO만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코스닥 상장에 평균 12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할 때 벤처캐피털은 3년 이내 초기 투자는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활기를 띠는 엔젤과 초기 투자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도 세컨더리펀드 결성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지난해 정부(모태펀드) 지원으로 220억원 규모 엔젤형 세컨더리펀드가 결성됐다. 국내 세컨더리시장은 대략 벤처투자시장(약 1조2000억원)의 5%인 6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