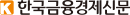`투자`와 `인수합병(M&A)`을 경험한 벤처 비중이 5% 안팎에 그쳤다. 투자·M&A가 벤처 `역동성`과 직결된 만큼 새 정부의 `제2의 벤처 활성화`에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2012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은 벤처와 인수합병(M&A) 경험이 있는 벤처 비중은 각각 6.5%와 4.9%였다. 지난해 조사치로 이전 경험 여부를 물은 것이어서 10년이 훨씬 넘은 한국 벤처의 실상이다.

벤치마킹 모델인 미국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규모는 지난해 기준 265억달러(약 28조8000억원)다. 우리나라 투자규모 1조2333억원과 비교해 약 23배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고려하면 크게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허수가 있다. 우선 엔젤(개인투자자) 투자다. 미국에서 파악하지 못한 엔젤투자 규모를 벤처캐피털 투자, 적게는 벤처투자의 80% 수준으로 본다. 벤처에 들어가는 투자금 규모가 연 500억달러 안팎에 이르는 셈이다.
투자처도 봐야 한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ICT)·문화콘텐츠·일반 제조가 엇비슷하다. 소프트웨어(82억6900만달러·이하 지난해 기준), 바이오기술(BT·41억4800만달러), 에너지(27억4800만달러) 등 역동적인 분야가 3대 투자처인 미국과 큰 차이다. 전문가는 3~5년 단기간에 투자와 회수를 해야 하는 벤처투자 특성상 가장 적합한 투자처는 ICT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비ICT 분야 투자가 많은 데에는 정부 정책방향도 영향을 미쳤다.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좌우하는 정부 모태펀드 재원 가운데 문화산업진흥기금 비중이 20%에 달한다.
정부도 여러 번 M&A 활성화에 나섰다. 하지만 개선 여지가 여전히 없다. 미국 벤처캐피털 자금회수(Exit) 현황을 보면 미국 벤처생태계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을 예측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벤처캐피털 회수 사례는 M&A가 322건으로 나스닥 등 상장(IPO)의 40건보다 8배가량 많았다. 전년도인 2011년은 M&A가 506건, IPO가 52건이다. 우리나라는 벤처캐피털 M&A 회수 사례조차 찾기 힘들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통계를 만들기 힘들 정도로 M&A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화 KAIST 교수(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는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M&A 시장이 커져야 한다”며 “대기업이 기술 벤처에 제값을 주고 인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