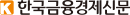지난 주말(현지시각 8·9일), 미국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선 전세계 게임마니아들이 몰리는 성대한 잔치가 펼쳐졌다. 세계 최대 게임업체로 손꼽히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전 세계 자사 게임 팬들을 불러모아 여는 `블리즈컨2013`이 바로 그 행사다.
우리나라서 지적되는 중독(?)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두달전 사전 구매에는 수십만명이 한 번에 몰려 4초만에 입장권 1만여장이 동이 날 정도다. 이를 찾은 사람도 미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 유럽, 아시아 전 대륙에 걸쳐있다. 미국 서부의 로스엔젤레스(LA) 남쪽 도시 애너하임을 찾기 위해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몰린 셈이다. 입장권 가격도 170달러로 적지 않다. 그렇다고 블리즈컨이 뭐그리 엄청난 것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다. 신작 게임 맛보기를 보여주는 정도다.
게임 맛보기를 보기 위해 미국 서부 한적한 도시까지 수만명이 결집한 것을 보면 병적인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국회에 `중독치유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이 광경을 봤다면 중독자로 보일게 분명하다. 말하자면 정신적 치료 대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블리즈컨에 운집한 사람들에게 중독자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게임을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위험행위라고 규정하는 목소리도 없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게임으로 비롯된 폐해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게임 마니아 가운데 일부는 총기를 이용해 살인을 저지르고 사고를 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를 게임의 탓만으로 돌리지 않는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건의 원인을 찾고 제대로 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한다. 우리 처럼 게임을 악의 근원이라고 규정해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는다.
일부 여당 의원이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킨 것은 그간의 연구결과 때문은 아니다(왜냐하면 국내에선 게임을 중독요인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연구를 해보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는 부모와 일부 의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을 뿐이다.
왠지 미국 서부의 어느 한 도시에서 차려진 잔치를 보는 한국 기자의 기분은 어느 때보다 씁쓸하다. 왜 우리는 이런 대규모 잔치를 벌이지는 못하더라도 게임을 중독요인이라고 몰아세우며 창조정신의 싹을 자르는지 안타깝다.
애너하임(미국)=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